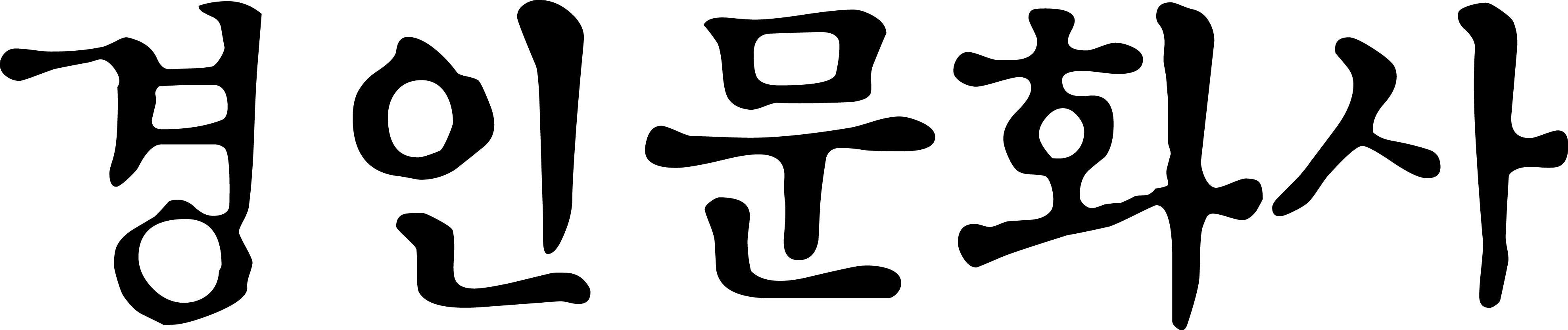- 돌아앉으면 생각이 바뀐다 격물과 성찰의 시간
- 13,000원
- 13,000원
- 판매중
- 종이와나무
- 종이 표지
- 기타
- 204쪽
- 2016년 4월 10일
- 9791195760206
- 책 소개
- 옛글에서 길어 올린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
옛 선현들은 책을 보면서 지식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공부(工夫)’를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변의 사물과 일상의 사건을 통하여 삶의 이치를 깨닫고 글로 남겼다. 이러한 옛글을 읽다 보면, 선인들이 삶을 꾸려가는 지혜와 자신을 넘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지은이 이종묵 교수(서울대 국문과)는, 절망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 마음에 품고 지침으로 삼을 만한 선현들의 글을 통해,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성찰의 시간을 독자에게 펼친다. 옛사람의 목소리와 지은이의 사유(思惟)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돌아보고 남을 감싸 안게 된다. 함께 실린 운치 넘치는 사진들이 글맛을 돋운다.
신변의 사물과 일상의 사건을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달은 선현들의 글,
막막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마음을 밝히는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다!
이 책은 저자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그리고 매일 겪은 소소한 일상과 사건 속에 묻혀 있는 의미를 들춰낸다. 저자와 동행하는 독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고전에 묻혀 청춘을 보낸 학자 눈에, 책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선현들이 하나둘 나타나 산책길에 동행한다. 그 선현들이 겪었던 삶과 그들이 깨달은 이치가 지금 보이는 일상과 사건에 고스란히 고여 있다. 이 책은 막막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마음을 밝히는 성찰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저자는 요즘이 “마음이 답답하고 영혼이 외로운 시대”라고 진단한다. “세사(世事)가 내 뜻과 같지 못하므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만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면 불우한 사람들이 쓴 옛글을 읽는다”고 했다.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슬픔밖에 없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불우함을 달래려면 우리보다 더 불우했던 옛사람이 남긴 글을 찬찬히 더듬어볼 일이다.
옛 선비들은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고뇌하며 그것들을 때로 밀치기도 하고 때로 끌어안기도 하면서 늘 가까이 두었다. 이런 사색과 행동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공부와 맞닿아 있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에 힘 쏟는 것이야말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바로 보는 철리를 얻는 일과 같다고 여겼다.
옛 선비들은 자신들보다 선대가 품었던 생각을 읽고 명상하면서 닮고자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뛰어넘고자 했다. 선대가 품었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설 때 뛰어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다. 옛 선비들은 ‘돌아앉으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오랜 공부를 통해 터득하고 있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온 힘을 쏟은
옛 선비들의 목소리, 지금 우리 앞에 불러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젊은 시절부터 읽어온, 그리하여 이제 저자가 모셔온 옛 선비들이 남겨놓은 목소리가 옹골차게 담겨 있다. 저자는 한동안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마음에 품고 지침으로 삼을 만한 선현들의 글을 찾아 헤맸다. 아니, 저자가 선현들의 체취가 물씬 묻어 있는 고전을 섭렵하다 보면, 그러한 선현들이 저자가 여행하는 고전의 길에 문득 나타나주었다. 그렇게 선현들의 글귀가 모이고, 저자는 암벽에 걸린 꽃을 따오듯 그 글귀를 따오고, 다시 그것을 깊게 살펴보고 마음속에 뒹굴게 했다. 이 책을 따라 읽는 동안 독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2부로 나눴다. 1부 ‘삶의 지혜’에 20편 글을 묶었고, 2부 ‘일상의 공부’에 19편을 모았다. 한여름 깊은 우물처럼 때로는 한겨울 모닥불처럼, 혀를 얼릴 듯 차갑게 얼굴이 달아오를 만큼 뜨겁게 파들어간 사유 39편 글이다. 그러나 혹시 읽기 전에 선현의 글 한 편에 생각 하나씩을 묶는 전통적이고 유행 타는 방식으로 책이 만들어졌다고 짐작하면 오산이다. 저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쓴다. 한 대목에 한 가지 생각을 풀어놓는 방식이 아니다. 저자가 ‘분노’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 시대에 ‘분노’가 갖는 의미를 캐들어가는 사유의 길목마다 불현듯 나타난 선현들이 자신의 글 한 편을 꺼내들고, ‘여보게 이것 좀 참고 하시게나’ 하면서 손을 내미는 듯하다. 그 결과 저자의 사유 한 편 그리고 글 조각 한 편에 수천 년 고금을 망라하는 선현들이 서너 분씩 불쑥불쑥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 조각을 만나볼 수 있다.
〈 만물과 함께하는 봄 〉21p
저자는 고려 문호 이규보(李奎報)가 봄날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은 〈춘망부(春望賦)〉라는 글을 한 대목 살펴보면서 시작한다.
화창하고 고운 봄이 한창일 때 높은 데 올라가 사방을 바라본다.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가 막 개자 나무는 목욕한 듯 깨끗하고 먼 강물은 늠실늠실, 버들가지는 파릇파릇. 비둘기는 구구 울며 날개를 치고, 꾀꼬리는 고운 나무에 모여 있네. 온갖 꽃 피어서 비단 휘장 쳐놓은 듯 푸른 숲과 어우러져 한층 더 아롱거리고 무성한 푸른 풀밭에는 소들이 흩어져 풀을 뜯고 있네. 여인은 광주리 끼고 여린 뽕잎을 따느라 섬섬옥수로 부드러운 가지를 당기면서 주고받는 노랫가락, 어느 무슨 곡조인가? 길 가는 이, 앉아 있는 이, 가다가 돌아오는 이들, 따스함을 즐기는 그 모습 눈에 삼삼하다네.
저자는 설이 지나고 3월이 가까워 올 때마다, 그래서 정말 봄이 턱밑까지 왔다 싶을 때면, 자신에게 다가올 봄 풍경이 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그러나 저자에게 춘삼월이 마냥 낭만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이규보가 남긴 다음 글귀를 저자는 더 정성스레 읽어간다.
경치와 형편에 따라, 어떤 이는 바라보아 기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바라보아 슬프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바라보아 흥겹게 노래하고, 어떤 이는 슬퍼 눈물을 짓나니, 제각기 유형에 따라 사람에게 느낌을 주니, 그 천만 가지 마음의 단서가 어지럽기만 하네.
저자 눈에는 똑같은 봄이건만 봄을 맞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부귀한 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끼고 술잔을 마주하고 풍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봄 풍경을 즐기지만, 남편을 먼 곳에 보낸 여인은 쌍쌍이 나는 제비를 바라보며 난간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저자는 “이번 봄은 다 함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어보는 ‘여물동춘(與物同春)’이라는 경지로 독자를 이끈다. 저자의 글 산책은 고려 이규보에서 다시 조선 초기 문인 홍귀달(洪貴達)로 이어달렸다가 다시 윤기(尹愭)라는 19세기 가난한 선비의 글로 향한다.
〈 철쭉을 기르며 깨닫다 〉27p
예전 선비들은 꽃을 보고도 공부를 하였다. 요즘은 책을 보고 지식을 얻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만, 예전 선비들은 책뿐만 아니라 일을 겪거나 사물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였고 다시 이를 자신의 바른 처신으로 연결하는 공부를 하였다. 이를 관물(觀物)의 공부라 한다. 이것이 예전 선비가 꽃을 보는 뜻이다.
16세기의 문인 이제신(李濟臣)의 집에 아주 귀한 일본 철쭉이 네 그루 있었다. 이제신은 주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초겨울에 멍석으로 잘 싸서 얼어 죽지 않게 하였는데, 이른 봄 집안일로 멍석이 필요하자 부득이 하나를 먼저 풀었다. 늦봄이 되자 세 그루의 철쭉은 일제히 꽃을 피웠지만, 멍석을 먼저 풀어준 철쭉은 봄이 다 가도록 꽃소식이 없었다. 멍석을 푼 후 갑자기 서리가 내렸기에 혹 얼어 죽었을까 조바심이 났다. 그러다가 음력 3월이 되어서야 느지막이 꽃을 하나씩 피우더니 5월 단오까지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 그 사이 윤달까지 들었으니 석 달 이상 꽃이 피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꽃과 잎이 다 고우면서도 싱싱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제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찍 풀어놓았기에 서리에 억눌렸고, 서리에 억눌렸기 때문에 차례대로 피어나는 것이요, 차례대로 피기 때문에 오래간 것이지요. 멍석을 풀어놓지 않았다면 어찌 손상을 입었겠으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어찌 오래갈 수 있었겠소?
〈 병든 사람을 위로하는 말 〉50p
마음이 죽고 사는 것에 걸림이 없다. 사람들이 병을 근심하는 것은 병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인데 죽음이 싫지 않다면 병을 근심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살아 있는 것 자체를 행운으로 생각하고, 아예 죽음까지 넘어선 달관의 마음으로 병든 자신을 위로할 방법은 없을까?
18세기에 조귀명(趙龜命)이라는 글 잘하는 선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다. 머리끝에서 팔다리 끝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큰일을 경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고 사소하게 즐길 거리조차 쉽게 할 수 없었다. 다들 즐거워하는 명절에도 끙끙대거나 움츠리고 방 안에 박혀 있어야 했다.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그러나 조귀명은 질병을 달관으로 극복하고자 〈질병의 이해(病解)〉라는 두 편의 글을 지었다. 그의 첫 번째 글에 벗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 벗은 병이 오히려 조귀명을 도운 것이라 하였다. 그 근거는 이러하다. 조귀명이 천성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글짓기를 좋아하므로, 병들지 않았더라면 세상 미녀들을 찾아다니느라 탕자(蕩子)가 되었을 것이요, 좋은 글을 지으려다 발광하여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니, 병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이 오히려 다행 아닌가, 벗은 그렇게 위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귀명은 스스로 세 가지 위안을 찾아 두 번째 〈질병의 이해〉를 지었다. 이 글에서 병의 가치를 세 가지로 말하였다. 첫째, 사람이 장수한다고 해보았자 80~90년 살지만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눈 깜빡할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질병의 고통이 심하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위안하였다.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하면 백 년 살았다 하여 장수했다 할 것도 없고 50년 살았다 하여 요절했다 안타까워할 것도 없다. 소식(蘇軾)도 〈적벽부(赤壁賦)〉에서 인간을 두고 망망한 바닷속 한 알의 좁쌀 창해일속(滄海一粟)이요, 백 년 삶이 하루살이의 하룻밤과 다르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둘째, 세상에 귀한 팔진미(八珍味)도 매일 먹는 부유한 아이의 입에는 익숙하여 그다지 맛난 음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맛난 음식도 가난한 자들이 먹어보아야 그 맛을 아는 법이다. 맛을 모르는 자에게 맛난 음식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건강도 마찬가지다. 평생 질병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지 못한다. 그러나 병에 걸린 사람은 어쩌다 한 해 중에 하루가 건강하고, 하루 중에 한 시간 탈이 없으면 그 행복이 비길 데가 없으니, 그 경지를 건강한 자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잠시 질병의 고통이 없는 날, 바람 자고 비 그치면 벗 두세 명과 나들이하면서 꽃구경을 하고 달구경도 하노라면, 그 통쾌함은 이루 비할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을 건강한 자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조귀명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고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들이 가지지 않은 즐거움을 가졌노라(雖有人之所無有之苦 而亦有人之所無有之樂)”고 자위하였다. 병에 걸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달관의 경지다.
셋째, 온 세상 만물은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 오직 내 몸뚱이가 있어야 이러한 병이 생긴다. 내 몸뚱이가 없다면 병이 어디에 붙겠는가? 이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은 즐겁지만, 죽는다 해도 그다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마음이 죽고 사는 것에 걸림이 없다. 사람들이 병을 근심하는 것은 병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인데 죽음이 싫지 않다면 병을 근심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살아 있는 것 자체를 행운으로 생각하고, 아예 죽음까지 넘어선 달관의 마음으로 병든 자신을 위로했다.
〈 분노를 다스리는 법 〉124p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히 분노의 시대라 할 만하다.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남보다 잘났는데 알아주지 않는 데서 생길 때가 많다. 저자는 먼저 조선 중기 학자 이현석(李玄錫)이 아우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본다.
요즘 사람들은 말로 남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수치로 여기고, 기운으로 남을 깔아뭉개지 못하면 수치로 여긴다.
분노와 욕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문득 시원하게 이를 없애버리는 일은 천하의 큰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다.
근대의 문인 김윤식(金允植)은 노년에 이런 글을 지었다.
사소한 일을 보고 사소한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리고 눈알을 부라려서 하루 사이에도 몇 차례나 낯이 붉어진다. 그러나 중대한 일이나 중대한 말을 당하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위세가 사라지며, 머뭇머뭇 물러난다.
저자는 이어서 조선의 선비들이 스승으로 떠받드는 주희(朱熹)를 찾아간다. 주희는 “기쁨과 성냄은 사람의 마음이요,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고, 성내야 할 것은 성을 내는 것이 도의 마음이다(喜怒, 人心也, 喜其所當喜, 怒其所當怒, 乃道心也)”라 하였고, 그의 벗 장식(張栻)은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는 없어야 하지만, 의리에서 나오는 분노는 있어야 한다(血氣之怒不可有, 理義之怒不可無)”라 하였다.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학자 이만부(李萬敷)가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들꽃을 가족으로 삼고 꾀꼬리를 풍악으로 삼아, 가슴속에 하나도 끌리는 것이 없다오. 해가 바지랑대보다 길어지면 일어나 한 사발의 보리밥을 먹소. 달기가 꿀과 같지요. 매번 당신을 떠올리면 감정의 뿌리가 마음을 닫고 분노한 기운이 가슴을 막을 듯하오. 낮에는 눈을 부라리고 팔뚝을 걷어붙이며 목과 얼굴까지 모두 벌겋게 되어 눈 내리듯 침을 튀기느라 밥상을 대하고도 먹는 것을 잊고 있겠지요. 밤이면 외로운 등불이 깜박거리는데 비단이불조차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길게 한숨 쉬고 짧게 탄식하느라 전전반측하는 모습이 떠오르오. 황면노자(黃面老子)의 백골관법(白骨觀法)으로 그 수심을 없애주지 못하여 한스럽소.
이만부가 분노로 인해 먹는 것과 자는 것조차 잊고 있는 벗에게 보낸 편지다. 직접 벗의 분노를 풀어주지 못하여 한스럽다고 하였지만, 이 편지글 자체가 문학으로 말한 백골관이다. 들꽃을 가족으로 삼고 산새를 풍악으로 삼아 느지막이 일어나 보리밥 한 사발 먹는 즐거움을 떠올리면, 일순의 분노가 절로 풀릴 것이라 한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잘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분노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고 더욱 분노하니, 온 세상은 점점 분노로 가득 차고 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분노가 일 때 이만부의 글이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을 듯하다.
〈 몸을 돌려 앉으면 생각이 바뀐다 〉172p
‘혁신’을 주창하는 요즘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18세기의 대학자 이용휴(李用休) 역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혁신을 이루었다. 이용휴는 발상의 전환에 의하여 창의성이 확보된다고 하였다. 협소하고 누추한 집에서 독서와 구도(求道)에 열중하고 있는 후학을 위하여 “이 작은 방에서 몸을 돌려 앉으면 방위가 바뀌고 명암이 달라지는 법, 구도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네”라고 하였다. 앉은 다리를 한 번 바꾸어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리니 이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 하였다.
책 속에서
비가 그쳐 약간 선선해질 때 난간에 기대 사방을 둘러본다. 산봉우리는 목욕이나 한 듯 허공에 파랗고 밝은 달은 동남쪽 트인 산 위에 떠올라 연못의 물과 어우러져 일렁거린다. 숲은 푸르고 하늘은 파랗다. 만물이 맑고 깨끗하다. 마침 시골 노인네들과 농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치가 잘되는지 못되는지, 어떤 인물이 좋고 나쁜지는 일절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런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옛글을 읽으면서 상상으로라도 즐길 수 있다. (32p)
권근(權近)은 얼굴이 검고 몸집이 작아서 사람들이 자신을 작은 까마귀라는 뜻의 소오(小烏)라고 부른다고 하고, 이 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리고 대머리와 검은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덕과 능력은 스스로 어떻게 배양하는가에 그 성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세상, 이러한 글이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37p)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남이 하는 것만 따라 하려고만 든다. (…) 사마천(司馬遷)은 젊은 시절 자신이 남들 따라 살다가 광혹(狂惑), 곧 미치광이 바보가 되었노라 후회하였다. 외롭지만 곧은길을 가는 것이 군자, 곧 지도자의 도리다. 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질에 뜻을 두어 허위에 빠지지 않고, 의로움을 좇아서 구차하지 않으며, 남들이 천 번 만 번 변하더라도 자신은 한결같이 한마음을 지켜야 한다. (60p)
“더위를 피하는 것은 다른 기술이 없다. 오직 마음을 맑게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묘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높고 통쾌한 누각을 즐겨 찾지만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더위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이라 하였다. (73p)
내가 말한 잊는다는 것은 잊을 만한데도 잊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모두 잊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은인과 원수는 잊어야 하는데도 내가 풀어버릴 수 없고, 영광과 치욕은 잊어야 하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다. 만물 중에 기뻐하고 노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고 옳게 여기고 그르게 여기는 것들이 또한 마음속에 어지럽게 딱 붙어 있으니, 내가 어찌 잊는 것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91~92p)
- 목차
- 1부 삶의 지혜
느린 말을 타는 여유
만물과 함께하는 봄
철쭉을 기르며 깨닫다
전원에 사는 즐거움
대머리라서 즐겁다
산수 자연에서 살아가는 네 가지 비결
푸성귀를 먹는 마음
병든 사람을 위로하는 말
조물주가 인간의 수명을 길게 주지 않은 뜻
시속(時俗)을 따르지 않겠노라
절제를 아는 꽃, 백일홍
꽃을 기르는 마음
더위를 피하는 법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서
매미와 고추잠자리
바위는 물을 만나야 기이해진다
대망(大忘)과 소망(小忘)
눈과 귀가 밝아지는 법
국화에서 배우는 정신
세상을 바꾸려거든 스스로 변화하라
2부 일상의 공부
단풍잎 편지
섭구충의 경계하는 마음
분노를 다스리는 법
남편과 자식이 없었다면
병 때문에 한가할 수 있다
색을 멀리하는 법
잉여를 알아주는 눈
광야에서 배운 공부
꿈속만이라도 한가했으면
사냥꾼도 잡지 못하는 꿩
일벌백계와 이병(二柄)
꿀벌을 통해 상생을 배우다
쉬었다 갑시다
몸을 돌려 앉으면 생각이 바뀐다
어진 이의 마음
나 살자고 미물인들 죽여서야
혀가 달린 금인(金人)
환갑, 삶의 즐거운 시작
에필로그 / 내 손 안의 다섯 수레 책